※ 아래 내용은 정진우 교수의「산업안전보건법」내용 중 필자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참고 요망

Ⅰ. 안전과 보건의 구별 실익
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임
□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직무 및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, 나아가 동법 제38조(안전조치)와 제39조(보건조치)를 통해 세부적으로 그 범위를 구분해 규율하고 있음
□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"안전"과 "보건"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, 안타깝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
Ⅱ. 안전과 보건의 개념 검토
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'안전'과 관련하여 '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예방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, 제39조에서는 '보건'과 관련해 '건강장해의 예방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
- 이것을 생각해 보면 위험의 방지가 '안전'이고 건강장해의 예방을 '보건'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
□ 다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법률의 내용을 해석할 때 모호한 회색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
- 가령 안전보건기준규칙 제618조 제1호는 '밀폐공간'에 대하여 산소결핍,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·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여기서의 유해가스는 건강장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화재·폭발(위험)을 야기할 수도 있음
□ 그렇다면 산업재해의 발생 매커니즘을 통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념을 정의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?
- 가령, ①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통상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②특이적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해보는 것임
□ 이에 따르면 만성요통, 진폐, 경견완증, 소음성 난청 등 모두 사고와 같이 이상한 상태가 아닌 통상의 상태에서 발생된 재해이고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'보건'이라 정의할 수 있음
- 반대로 폭발, 누전 또는 추락 등 특이적 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'안전'이라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임
Ⅲ. 안전과 보건 정의의 한계와 시사점
□ 다만, 위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일괄적인 기준을 대입해 안전관계기준과 보건관계기준을 구분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
□ 예를 들어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규정(안전보건기준규칙 제3편 제1장)은 일반적으로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,
- 이 장에 있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'사고 시의 대피 등'(안전보건기준규칙 제438조)의 규정은 보건관계기준으로 볼 수 없을 것임
□ 정리하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개념은 상호 간에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
-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[참고 문헌]
정진우, 산업안전보건법(2024), 중앙경제, 38~40P
'산업안전보건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산안-25003] 안전보건관리체제 : 안전보건관계자 (4) | 2025.07.06 |
|---|---|
| [산안-25002]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의무 (2) | 2025.06.06 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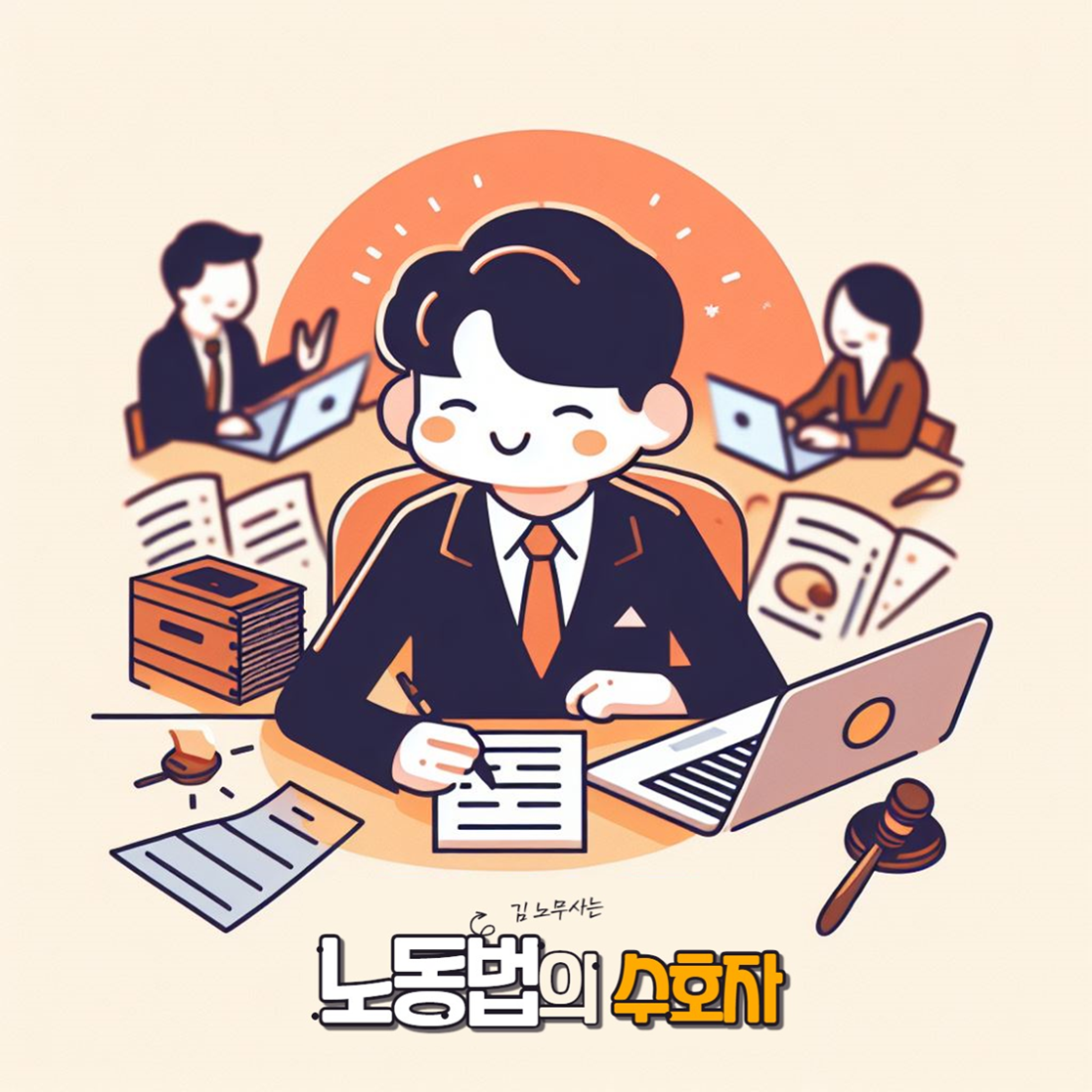


댓글